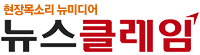조용한 행진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민들은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며 묵념을 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11일 광화문광장 태극기집회를 피해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는 비정규직 3000여명이 가두행렬을 진행했다.
이들이 행렬을 통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바로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故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후 50여명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발전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해 안간힘도 써봤다. 하지만 모두가 제자리걸음이었다.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들도 여전했고, 방관하는 이들도 그대로였다. 책임자 문책은 이제 더 이상 헛심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행진 참여자들은 김용균씨 이후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영정을 들고 시민들 앞에 나섰다. 행렬 일부에는 그들의 가족들도 섞여 있었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도 그 중 일부였다. 김 씨는 이날 행렬에서 마이크를 잡고 "비정규직이 여전히 많은 우리나라"라며 "아울러 비정규직들만 현장에서 사망한다. 참 몹쓸 우리나라다. 모두가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한데, 현장에서는 파리 목숨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바꿔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살려야 내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이끌어 낸 나라의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약속을 믿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외친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오늘도 사내하청으로 차별을 당한다. ILO 핵심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 5만의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조차 박탈했다"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