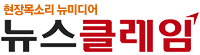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작업중지권 적용 확대는 물론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안전인력 채용 등에 투자를 늘리는 모양새다. <뉴스클레임>은 이 같은 움직임이 언제, 어디서부터, 왜 시작됐는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기획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역대급 폭염의 합작품이었다. 지각장마가 불과 17일 만에 종료되면서 여름비를 만끽하기도 전에 따가운 햇볕을 맞이해야 했다.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안전 안내문자 때문이다. ‘무더위 시간대 외출 및 야외작업 자제, 챙 넓은 모자 또는 양산 쓰기, 물 마시기 등 폭염 안전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폭염 지속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양산 쓰기,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 이용, 부모님 안부전화 드리기 등 안전관리에 유의 바랍니다’가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겐 무용지물이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라고 말하던 2018년과 비슷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어도, 옥외작업 근로자들은 더위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기도 힘든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일해야 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자연스레 사망으로 이어진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36명이다.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또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국 326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47곳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폭염에 노출된 채 일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1050곳 중 191곳에서 예방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선 노동현장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글자로는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폭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중지에 따른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노동자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작업 거부 시 징계 및 손해배상이 따를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만 받는다.
때문에 작업중지를 법제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최영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침권고 만으로는 현장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 때문에 폭염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제도 실질화를 위해서 국회가 법 개정 작업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임금 보전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전격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은 인권위에서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온열질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노동부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정부’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선포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죽음엔 느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폭염에 내몰려 죽음을 겪는 노동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것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다. 기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가 자본 징계에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 시작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열어줘야 한다.